
통도사(通度寺) 반야암(般若庵) 조실(祖室) 요산(樂山) 지안(志安)스님을 비롯한 세 분 스님들께서는 청정도량(淸淨道場) 바라밀선원 불전(佛典)으로 나아가 죽비(竹?)에 맞춰 부처님전에 3배(三拜)의 예(禮)를 올렸다. 이어 김달곤 회장, 문수혜 보살, 만다라 보살, 다원화 보살께서 불전(佛典)으로 나아가 정좌(正坐)한 네 분 스님들께 예(禮)를 다해 가사(袈裟)를 올렸다. 사부대중(四部大衆)들은 다함께 불전(佛典)을 향해 섰다.

이날 주지 수담 인해(仁海)스님께서는 <“해탈복(解脫服)이여! 무상복전의(無上福田衣)로다/ 아금정대수(我今頂戴受)하노니/ 세세상득피(世世常得被)하여지이다”> 라며 가사점안(袈裟點眼)에 대한 <해탈송(解脫頌)>을 올렸다. 가사(袈裟)란 <불교(佛敎)>의 <의발(衣鉢)>로 <가사(袈裟)>와 <바리때(발우.鉢盂)>를 말한다. <전법(傳法)>의 표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물건(物件)>이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행심반야바라밀다시(行深般若波羅蜜多時)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께서 피안(彼岸)에 도달할 때에 다섯가지가 모두 공(功)한 것임을 비추어 보고 일체(一切)의 괴로움과 액란(厄難)을 제도 하였나니라.
사리자(舍利子) 색불이공(色不異空) 공불이색(空不異色)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수상행식(受想行識) 역부여시(亦復如是)/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아니하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수상행식도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舍利子) 시제법공상(是諸法空相)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 사리자여! 이 모든 오온(五蘊)에서 구분하여 둔,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그 낱낱과 같은 모든 법(法)의 명목, 모든 <법(法)의 공(空)된 형상(形象)>은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나니라.
시고(是故) 공중무색(空中無色) 무수상행식(無受想行識)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 무안계 내지무의식계(無眼界 乃至無意識界)/ 이러한 까닭에 공(功) 가운데는 색(色)이 없으며, 수상행식도 없으며, 눈. 귀. 코. 혀. 색신(色身) 의식(意識)도 없으며, 빛깔. 소리. 향기. 맛. 몸에 와닿는 느낌. 인식(認識)도 없으며, 안식(眼識)의 경계로부터 의식(意識)의 경계까지도 없는 것이다.
무무명(無無明) 역무무명진(亦無無明盡) 내지무노사(乃至無老死) 역무노사진(亦無老死盡) 무고집멸도(無苦集滅道)/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이 다한 것도 없고, 내지는 늙어 죽는 것도 없으며, 늙어서 죽어 다 마친 것도 없느니라.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의 괴로움을 없게 하는 것과 괴로움을 없도록 하는 방법도 없다.

무지역무득(無智亦無得) 이무소득고(以無所得故) 보리살타(菩提薩?) 의반야바라밀다고(依般若波羅蜜多故) 심무가애(心無??) 무가애고(無??故) 무유공포(無有恐怖) 원리전도몽상(遠離顚倒夢想) 구경열반(究竟涅槃)/ 지(智)도 없고 득(得)도 없으며, 얻을 것이란 없는 연고로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고로 두려움이 없으며, 전도(顚倒)된 몽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드느니라.
삼세제불(三世諸佛) 의반야바라밀다고(依般若波羅蜜多故) 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得阿褥多羅三?三菩提)/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셨나니라.
고(故) 지반야바라밀다(知般若波羅蜜多) 시대신주(是大神呪) 시대명주(是大明呪) 시무상주(是無上呪) 시무등등주(是無等等呪)/ 이런 까닭으로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무엇과 비길 더 없는 주문이니라.
능제일체고(能除一切故) 진실불허(眞實不虛) 고설반야바라밀다주(故說般若波羅蜜多呪) 즉설주왈(卽說呪曰)/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고 참으로 실다워서 헛되지 않느니라. 고로 반야바라밀다의 부문을 설하노라. 즉 주문을 이렇게 설하노라.
아제(揭諦) 아제(揭諦) 바라아제(波羅揭諦) 바라승(波羅僧) 아제(揭諦) 모지사바하(菩提娑婆訶)”> 봉독(奉讀) 후,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승공여성중창단에 맞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歸依佛)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歸依法)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歸依僧)’ <삼귀의(三歸依)>를 비롯해, “찬불가 <보현행원(普賢行願)> ‘내 이제 두 손 모아 전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 어둔 이 내 몸 굽어 살피사/ 위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배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니’ 다함께 음성공양(音聲供養)을 올렸다.
이어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감로법을 주소서/ 새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전하옵소서” 조실(祖室) 요산(樂山) 지안(志安)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음성공양(音聲供養) 올린 후, 스님께 3배(拜)의 예(禮)를 올렸다. 잠시 입정(入靜)이 있은 후 지안(志安)스님께서는 법좌(法座)에 올라 감로법(甘露法)을 주셨다.

이날 지안(志安)스님께서는 앞서 축원(祝願)에 이어 법문(法門)을 통해 “오늘 이렇게 바라밀선원에서 엄숙하고 성대한 뜻 깊은 가사점안(袈裟點眼) 법회를 봉행했다. 바라밀선원이 개원되고 여러 가지 법회를 많이 열어 왔지만, 오늘은 다른 법회보다 특별한 법회다. 가사(袈裟)를 지어서 부처님께 올리고 그걸 증명(證明)하는 음식을 올리는 법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기 위한 생존(生存)의 기본 조건 세가지를 의(衣).식(食).주(住)라 한다. 의(衣)는 옷이고, 식(食)은 음식(밥)이고, 주(住)는 집이다.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衣食住)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옷, 밥, 집이 있어야 한다.
요즘은 주택(住宅)이 날로 고급화 되어 가고 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집 가운데 가장 좋은 집이라 하면 옛날 왕조시대(王朝時代)의 왕(王)들이 사는 왕궁(王宮)이라 할 수 있다. 경전(經典)에도 왕상궁(王上宮)이라는 말이 있다. 인도(印度)에 가면 영축산(靈鷲山) 그 밑에 죽림정사(竹林精舍)가 있다. 그 곳을 왕상궁(王上宮)이라 했다. 죽림정사(竹林精舍)라는 집이 잘 지어져 있고 눈에 뛴다. 저 멀리에서도 왕(王)이 사는 집이구나 알 수 있다. 왕(王)의 집이 있는 궁(宮)이다. 왕(王) 자체가 신분(身分)이 최고(最高) 높으니까 가장 좋은 집에서 산다.

요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靑瓦臺) 이 집이 정치적(政治的)인 권력(權力)이 다 집중(集中)돼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음식 즉 임금이 드시는 음식을 진수성찬(珍羞盛饌)이라 한다. 현재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어떤 곳에서는 반찬이 2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도 있다. 그리고 옷을 얘기하면, 옷 중에 최고(最高)의 옷은 <가사(袈裟)>다. 세속(世俗)의 옷이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 하더라도, <가사(袈裟)> 한 벌을 당할 수가 없다. <가사(袈裟)는 해탈복(解脫服)>이라 해서 이 옷을 입게 되면 언젠가는 <해탈(解脫)>을 얻게 된다. 생사(生死)를 해탈(解脫)한다.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해탈복(解脫服)은 입는 스님들이 직접 만들어 입지 못한다. 보통 세속복(世俗服)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 입거나, 돈을 주고 사 입는 경우도 있고, 옷을 잘 만드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지어 입을 수도 있다. 이 <해탈복(解脫服)>은 부처님 옷을 상징(象徵)하는 옷이고 <수행자(修行者)>가 입는 옷이다. 이건 과보로부터 얻는 옷이다. 자기가 직접 지어 입는 옷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해탈복(解脫服)>을 지어서 부처님께 바칠 때 <복전의(福田衣)>라 한다. 이 옷에는 엄청난 복(福)이 지어지는 옷이다. <해탈복(解脫服)>, <복전의(福田衣)>라 불린다.

이 <가사불사(袈裟佛事)>가 큰 절에서는 정기적으로 행(行)해 지고 있다. 이런 작은 포교당(布敎堂) 바라밀선원(波羅蜜禪院) 같은 곳에서 가사불사(袈裟佛事)를 하기는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사(袈裟)>를 지어서 <시방삼보전(十方三寶典)>에 공양(供養)하게 됐다. <가사(袈裟)>를 입으면 <번뇌(煩惱)>가 가라 앉는다. 저는 <통도사(通度寺)>에서도 <조계종(曹溪宗)>에서도 보내준 <가사(袈裟)>가 몇 벌 있다.
오늘 이 <가사(袈裟)>가 정성(精誠)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소량(小量)을 제작(製作)해서 그런지 잘 지어진 것 같다. 이 <가사(袈裟)>에는 여러 가지 <영험설화(靈驗說話)>가 많이 있다. <가사(袈裟)>는 <인도(印度)>에서는 버려진 낡은 천을 기워서 만든 옷이라 해서 <분소의(糞掃衣)>라고 했다. 이 옷을 입는 사람, 지어주는 시람, 기워주거나 빨아주는 이에게도 엄청난 큰 공덕(功德)이 성취(成就)된다. 이 <가사(袈裟)>에는 엄청난 <공덕(功德)>이 있다.

1981년도에 세계적(世界的)으로 유명(有名)한 대학자(大學者)인 프랑스 사람 ‘트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해인사(海印寺)>, <통도사(通度寺)>, <경북안동(慶北安東) 하회(河回)마을> 등 옛날 선비들이 많이 살았던 <전통(傳統)마을>을 답사(踏査)했다. 벌써 3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제가 그 분을 안내해 가지고 <통도사 극락암(極樂庵)>에 주석하시던 <원광(圓光) 경봉(鏡峰) 큰스님>을 친견(親見)하기 위해 모셔갔다. <경봉(鏡峰)스님>은 <통도사(通度寺) 주지(住持)>를 두 번 역임(歷任)하셨고,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에게 <화엄경(華嚴經)>을 배웠다. 현재 <통도사(通度寺) 극락암(極樂庵)>에는 <경봉(鏡峰)스님>께서 주석(主席)하셨던 <삼소굴(三笑屈)>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분이 제가 입고 있는 <가사(袈裟)>를 자꾸 쳐다보더니 <“한국(韓國)의 스님들이 입는 가사(袈裟)는 굉장히 엄숙(嚴肅)해 보인다”>라며 <“이 가사(袈裟)를 입고는 나쁜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이 분이 <한국(韓國)>에 오기 전에 <일본(日本)>에 상당기간 머물렀다. <일본(日本)>에는 스님이 <출가(出家)>해서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로 사는 이들이 거의 없다. <한국(韓國)의 불교(佛敎)는 매우 청정(淸淨)한 것 같은데 일본(日本) 불교(佛敎)는 이미 세속화(世俗化) 된 것 같다>라고 말해 언론(言論)에 보도(報道)되기도 했다.

물론 <가사(袈裟)>가 스님들이 소화하는 <법복(法服)>이지만 이 <가사(袈裟)>에 <불교(佛敎)>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理解)하시고 또 이런 <불사(佛事)>를 계획(計劃)해서 <삼보전(三寶典)>에 <공양(供養)>한 <공덕(功德)>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또 <불교(佛敎)>의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과 <지장보살(地藏菩薩)>의 원력(願力)을 설(說)해 놓은 <지장본원경(地藏本願經)>도 있다.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에 보면 하루의 수행(修行)을 잘 못해도 <가사(袈裟)>를 입고 있는 사람은 ‘세상(世上) 사람들이 존경(尊敬)해 줄만하다’는 말이 나온다.
<말세(末世)>에는 전법시대(傳法時代) 만큼 수행(修行)의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아서 세속(世俗) 사람들에게 허물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말세(末世)에 <가사(袈裟)>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마음>, <공경(恭敬)하는 마음> 한번만 일으켜도 <복(福)>이 된다. 그래서 <불교(佛敎)>는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 옷, 법복(法服), 원래 가사(袈裟)를 두고, 순수하게 믿는 마음을 부처님은 ‘<해>와 같다’고 했다. <해>가 떠야 세상이 밝아지지 <해>가 지면 캄캄한 세상(世上)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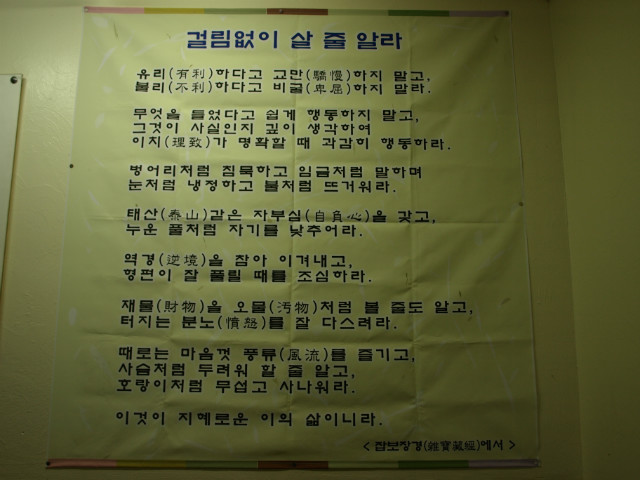
<가사(袈裟)>는 <빛>을 보고 따라 간다. <불교(佛敎)> 믿는 것을 <빛>을 보고 따라 간다고 한다. <가사(袈裟)>는 <빛>이다. 그러므로 <가사(袈裟)>를 입은 스님의 개인적인 성향(性向)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옷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통해 불교(佛敎)를 상징(象徵)하는 의미의 가사(袈裟)를 존중하는 마음이 되면 그런 허물을 안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사불사(袈裟佛事)>를 한 이 <인연(因緣>)을 어디로 이어야 하는가(?) 서울에 <금강선원(金剛禪院)>이라는 절이 있다. 그 절 3층에 <탄허(呑虛)스님 박물관>이 있다.
그 절에서 <제5회금강경강송대회>가 열려 심사위원장으로 초청되어 갔다. 전국에서 수 백 명이 참여했다. 상금이 여러 수 백만 원이었다. 전국 경향각지에서 400여 명 정도 참석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금강경(金剛經)>을 다 외운다. <경(經)>을 열심히 외우는 사람은 <경(經)>을 열심히 외우고, <염불(念佛)>을 하는 사람은 <염불(念佛)>을 열심히 하고, <절(節)>을 하는 사람은 <절(節)>을 열심히 하고, <사경(寫經)>을 하는 사람은 <사경(寫經)>을 열심히 하고, 이것이 <불교(佛敎)>를 <실천(實踐)>하는 방법이다.
<참선(參禪)>을 하는 사람은 <참선(參禪)>을 하고, 자기 <근기(根氣)>에 맞춰 <체질(體質)>에 따라서....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하면 <불보살(佛菩薩)>의 <가피(加被)>를 입는 수가 있다. <수행(修行)>만 꾸준히 열심히 해도 그 결과 큰 <공덕(功德).이 성취(成就)된다. 그래서 <불교(佛敎)>는 부처님 가르침이 <빛>, <광명(光明)>이다. <법(法)>을 의지(意志)하지, 사람을 의지(意志)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금강경(金剛經)>의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라는 법문(法門)이다. 오늘 이 <가사불사(袈裟佛事) 점안식(點眼式)>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精進)>해 나가시기 바란다.
주지(住持) 인해(仁海)스님께서는 <가사점안식(袈裟點眼式)> 불사(佛事) 공덕(功德)이 원만하게 이뤄진 것에 대한 증표(證票)로 20여 년 동안 지니셨던 가사(袈裟)를 잘라 사부대중(四部大衆)들께 한 조각씩 선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