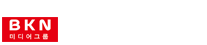<기자메모>“장례(葬禮)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 장례비용으로 2000만원이상 지출
조재환 기자 기자 2013-09-25 00:00:00

장례식방송화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한번 장례를 치르는데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8명은 장례비 지출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화장 장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군인으로 입대한지 불과 두 달 남짓 되었다. 그동안 가장으로서 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과 병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랜 투병생활로 사망하게 되었다. 급작스런 부고(訃告)소식에 집에 돌아 왔지만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A씨는 우선 병원으로 옮기고 장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화장을 고려했음에도 평균 180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장례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구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 담당에게 문의 하면 장례용품 50~100% 지원과 안 치료, 시설 사용료 무료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보통은 장례비용만 최소 276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군청간 협약 체결로 50만 원 선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장례는 한마디로 돈을 먹는 하마다.
전국에서 최근 3년간 장례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장례비용이 매장할 때 2229만원, 화장 후 납골당을 이용할 때 2032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례비 사용 내역별로는 매장이나 화장에 관계없이 지출하는 접객비 등 장례식 관련 비용이 평균 18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비용은 947만원, 납골안치 비용은 290만원,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장례식 장소로는 병원이 64.8%에 달했으며 ▲자택 6.5% ▲전문장례식장 24.8% ▲종교시설 3.9%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의 94.3%가 장례비용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나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대답한 5.7%의 결과와는 극히 대조적이었다.
이와 반대로 B씨는 상조가입으로 장례 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10년을 적립한 “가”상조회사가 부도가 나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폐단을 막고자 2011년 3월18일부터 선 불식 할부거래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일정금액의 50%를 의무적으로 주거래은행이나 한국 상조공제 조합에 적립해야 하는 제도로서 고객들은 상조회사가 부도 시(侍)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는 “나"회사로 이관되어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관된 회사가 장례서비스를 하지 않고 여행이나 혼례 등으로 대체를 종용(慫慂)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나 장례서비스 횟수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 같다.
상조회사에서 장례 서비스 대신 다른 경조사 상품이나 여행, 어학연수 상품 등을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고객이 대금을 납부하다가 해당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타 회사로 이관되는 경우, 이관된 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소비자는 오직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관한 회사에서 선수금은 이전받지 않았다며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에서 발을 빼 버리면 소비자는 이전 업체에 납입한 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할부거래법으로는 장례 등 일부 상품 외에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도 없고, 해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상조상품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대한 부수한 재화’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정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역시 장례와 혼례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장례의식의 변환과 함께 정확한 정보 습득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올바른 상조서비스를 선택해서 많은 장례비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A씨는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군인으로 입대한지 불과 두 달 남짓 되었다. 그동안 가장으로서 초등학교 다니는 여동생과 병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랜 투병생활로 사망하게 되었다. 급작스런 부고(訃告)소식에 집에 돌아 왔지만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A씨는 우선 병원으로 옮기고 장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화장을 고려했음에도 평균 180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장례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구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 담당에게 문의 하면 장례용품 50~100% 지원과 안 치료, 시설 사용료 무료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보통은 장례비용만 최소 276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군청간 협약 체결로 50만 원 선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장례는 한마디로 돈을 먹는 하마다.
전국에서 최근 3년간 장례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장례비용이 매장할 때 2229만원, 화장 후 납골당을 이용할 때 2032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례비 사용 내역별로는 매장이나 화장에 관계없이 지출하는 접객비 등 장례식 관련 비용이 평균 18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비용은 947만원, 납골안치 비용은 290만원,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장례식 장소로는 병원이 64.8%에 달했으며 ▲자택 6.5% ▲전문장례식장 24.8% ▲종교시설 3.9%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의 94.3%가 장례비용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나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대답한 5.7%의 결과와는 극히 대조적이었다.
이와 반대로 B씨는 상조가입으로 장례 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10년을 적립한 “가”상조회사가 부도가 나서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폐단을 막고자 2011년 3월18일부터 선 불식 할부거래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일정금액의 50%를 의무적으로 주거래은행이나 한국 상조공제 조합에 적립해야 하는 제도로서 고객들은 상조회사가 부도 시(侍) 5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는 “나"회사로 이관되어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관된 회사가 장례서비스를 하지 않고 여행이나 혼례 등으로 대체를 종용(慫慂)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나 장례서비스 횟수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 같다.
상조회사에서 장례 서비스 대신 다른 경조사 상품이나 여행, 어학연수 상품 등을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고객이 대금을 납부하다가 해당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타 회사로 이관되는 경우, 이관된 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소비자는 오직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관한 회사에서 선수금은 이전받지 않았다며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에서 발을 빼 버리면 소비자는 이전 업체에 납입한 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할부거래법으로는 장례 등 일부 상품 외에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도 없고, 해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상조상품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대한 부수한 재화’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정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역시 장례와 혼례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장례의식의 변환과 함께 정확한 정보 습득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올바른 상조서비스를 선택해서 많은 장례비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