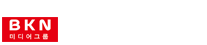홍철훈 칼럼니스트바다가 인류 삶에 제일 먼저 끼어든 건 아마도 밀물 썰물일 것이다. 때 되면 밀려와 바위에 앉아서도 낚시가 잘 되고 또 때 되어 밀려 나가면 드러난 갯벌에서 온갖 해산물을 채집해 먹을거리가 윤택해져서다. 또 폭풍 때처럼 함부로 범람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두렵지도 않았을 것이다.
홍철훈 칼럼니스트바다가 인류 삶에 제일 먼저 끼어든 건 아마도 밀물 썰물일 것이다. 때 되면 밀려와 바위에 앉아서도 낚시가 잘 되고 또 때 되어 밀려 나가면 드러난 갯벌에서 온갖 해산물을 채집해 먹을거리가 윤택해져서다. 또 폭풍 때처럼 함부로 범람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두렵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엔 밀물 썰물의 운동을 조석(潮汐, tide)이라 한다. 지구상 어느 해역이든 그 조석의 크기나 주기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만유인력에 의해서 발생하고 특히 달과 태양이 조석을 일으키는 핵심 구동력임도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도 얼핏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왜 밀물 썰물은 하루에 두 번 있나? 왜 서해는 조석의 영향이 큰데 동해는 거의 없나? 또 인천 근해는 조차가 약 10m 정도로 유별나게 큰가 등이다.
첫 번째 의문은 일찍이 뉴턴이 풀어주었다. 그는 만유인력을 발견하면서 조석은 달(또는 태양)의 인력(引力) 탓임을 알게 되었다. 다만, 지구와 달은 함께 공전(公轉)하므로 지구 위 모든 점에서는 같은 ‘회전 원심력(구심력)’이 작용하는데, 달 쪽은 거리가 가까워 인력이 원심력보다 훨씬 커 인력에 의해 바닷물이 배불뚝이처럼 해수면이 ‘불룩(밀물)’해지고, 동시에 달 반대쪽은 되레 원심력이 인력보다 훨씬 커 원심력이 해수면의 ‘불룩(밀물)’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지구가 자전할 때 달 쪽과 그 반대편이 동시에 해수면의 ‘불룩’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구가 반시계방향으로 자전(1일)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달 쪽과 달 반대쪽에 갔을 때 각각 한 번씩 ‘불룩(밀물)’이 생기므로 하루에 2번 밀물이 생긴다. 물론 썰물은 우리나라가 달 쪽에서 멀어졌을 때 생긴다. 덧붙여, 달과 태양의 인력이 겹치면(보름 또는 그믐 직후) 조차(불룩)가 가장 큰 사리(大潮, spring tide)가 되고, 서로 비켜 작용하면(상현 또는 하현 직후) 조차가 가장 작은 조금(小潮, neap tide)이 된다.
한편, 서해는 동해(평균수심 약 1,684m)보다 수심이 낮아(평균수심 약 45m) 파동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 파가 밀려 파고가 높아지고, 또 반 폐쇄적인 길쭉한 분지 구조인 데다 남쪽이 넓고 북쪽이 좁은 병목 형태라 파동이 몰려 증폭을 유도한다. 더구나 바닥이 갯벌구조면 더욱 큰 조차를 만든다. 인천은 조차를 극대화하는 이 모든 조건에 가장 적합한 곳인 셈이다. 특히 인천 앞바다의 지형적 협수로는 파 에너지의 집중화를 유인해 파고를 높이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하나 더 지적할 것은, 바다의 파동 중에 북반구에서는 오로지 해안을 오른쪽으로 보고 진행하는 켈빈파(Kelvin wave)가 있는데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한반도 어디건(예로서 동해안 쪽) ‘불룩’이 발생하면 켈빈파가 동해안→남해안→서해안을 따라 진행하는데, 그 진행속도가 서해에 들어서면 달 조석주기(12.42시간) 동안 약 900km를 이동한다. 이 크기는 서해 길이(약 1,200km)와 비슷해 달 조석주기와 공진(共振)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즉 서해의 지리적인 고유(固有)진동과 달 조석 운동으로 발생한 켈빈파(또는 조석파)의 진동이 공명(共鳴, resonance)을 일으켜 증폭을 가속해 조차를 크게 만드는 데 한몫한다는 것이다.
한편, 동해는 깊고 파동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달 주기와 공명 조건도 안 맞고 열린 바다라 파가 지체될 이유도 없으며 지형조건마저도 서해와 달리 단순해 어느 것도 조석파(또는 켈빈파)의 증폭 조건에는 안 맞는다. 그런 탓에 평균조차가 0.3~0.5m 수준으로 매우 작아 실로 밀물 썰물을 느끼기도 어려울 정도라 할 것이다.
생전에 뉴턴은 “나는 바닷가를 거닐며 늘 이 숱한 모래알 속에서 하나의 예쁜 조가비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 한다. 그 ‘조가비’ 중 하나가 ‘조석 운동의 원리’가 아니었을까? 실로 사색의 풍요는 예쁜 조가비를 찾으려는 ‘호기심’ 속에 있나 보다.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명예교수
홍철훈(해양물리학·어장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