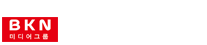홍철훈 칼럼니스트부산 남구에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이하 써밋이라 함)’ 아파트가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인 D 개발사 간 공사비 소송으로 야단이다. 지난해 1월, 준공해 이미 2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임에도 D 개발사가 지난 5월, 조합을 상대로 약 600억 원의 ‘공사비 추가 청구소송’을 제기해 사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서다.
홍철훈 칼럼니스트부산 남구에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이하 써밋이라 함)’ 아파트가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인 D 개발사 간 공사비 소송으로 야단이다. 지난해 1월, 준공해 이미 2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임에도 D 개발사가 지난 5월, 조합을 상대로 약 600억 원의 ‘공사비 추가 청구소송’을 제기해 사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서다.
이러한 조합ㆍ건설사 간 ‘공사비갈등’은 비단 ‘써밋’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 핵심 원인으로는 ‘공사비 사전확정 미비’, ‘감리 및 검증 기능 부재’, ‘시행 조합의 전문성 부족’, ‘지자체의 방관’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분양가와 분양률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걸린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시공건설사는 초기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시공권을 우선 확보한 뒤에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만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시행 조합 측은 대다수 전문성과 정보력이 부족해 초기계약 때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쉽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실질적 대응 역량이 부족해 시공사에 끌려가는 경우가 흔하다. D 건설사에 추가공사비로 이미 160억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로 그 3.5배 이상을 요구해 법적 소송까지 간 셈이 되었다.
문제는 이 통에 입주민(조합분양자)이 계약의 주체가 아닌데도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적 약자가 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 등기 지연, 재산권 행사 제한, 분양수익금 환급 지연 등의 문제가 따라붙고 소송이 장기화하면 전세나 이주비 부담 등 이중고를 겪어야 하고 전매나 대출에도 곤란을 겪는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은 조합과 건설사와의 자율계약에 대부분을 맡기고, 공사비 책정 과정에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공사비 분쟁’이 건설업계의 영세재정구조나 도시정비시장 주도권 확보와 맞물려 더욱 과열되어 커다란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이미 ‘관행’처럼 굳어졌고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 미국 등은 공사비와 설계비 확정 과정에 공공 감리 또는 제삼자 중재 기관이 개입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있다 한다. 최근에 이르러 관계기관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케 하는 등, 일부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 하나 법령제정단계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다.
더는 입주민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공사비 계약과 정산, 그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표준화된 가이드 라인과 사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법적으로 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관여해 일정 역할을 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사비 증액 시 반드시 ‘감리단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삼자적 검증 절차가 꼭 필요하다.
주택공급 정상화와 건설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는 더는 방관해선 안 된다. ‘입주민’이 ‘희생양’이 되는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현장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만시지탄이지만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때다.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명예교수
홍철훈(해양물리학·어장학 전공)